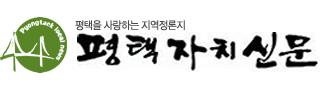평택시사(平澤市史)
Home > 평택시사(平澤市史)
실시간 평택시사(平澤市史) 기사
-
-
평택시史로 보는 ‘원평동 한성공동창고 터’
-
-
1905년 9월 고종황제 내탕금 30만 환 가운데 15만 환으로 설립
▲ 일제강점기 한성공동창고 터(2013)
◆ 원평동 한성공동창고 터
한성공동창고 주식회사는 1905년 9월 ‘공동창고주식회사 장정’ 이후 고종황제 내탕금 30만 환 가운데 15만 환으로 설립됐다. 회사는 창고업무와 보세창고업무,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인천과 강경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1907년 8월 1일 평택정차장(원평동 평택역 앞)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평택출장소는 일반상품 보관, 보관 물품에 대한 금융, 환전 등의 영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12년 2월 1일 대한천일은행의 후신인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됐다. 조선상업은행은 1923년 원산상업은행, 1924년 조선실업은행, 1925년 대동은행, 1928년 삼남은행, 1933년 북선상업은행, 1935년 부산상업은행, 1941년 대구상공은행과 합병했다.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는 우리은행이다.
한성공동창고 주식회사의 위치는 구 평택역전 1등 도로와 본정통이 갈라지는 사거리 모서리에 위치했다. 원평로 36번길 164 일대다.
◆ 팽성읍 노양리 수위측정소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기 전 팽성읍 노양리 일대는 안성천 하류 바닷가였다. 안성천 하류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수로 및 해로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지만 해일과 수해가 빈번해 피해가 많았다.
노양리 수위측정소는 안성천 하구 바닷물의 높이를 재기 위해 설치했다. 본래의 위치는 노양리 서북쪽 바닷가 지점에 있던 것을 1974년 아산만방조제를 준공하고 노양리 일대 바닷가가 평택호에 수몰돼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보존했다. 수위측정소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현재 목조 테크가 설치됐으며, 내부에는 자동으로 물 높이를 측정하는 계기판이 있었다.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높이는 3m 내외, 폭 1.5m 내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91호)에서는 ‘평택시 근대문화유산 - 원평동 평화병원 건물’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8-18
-
-
평택시史로 보는 ‘원평동 평택금융조합 터’
-
-
1914년 평택금융조합 설립 후 서정리금융조합, 안중금융조합 설립
▲ 1920년대 금융조합거리
대한제국은 1907년 5월 지방금융조합규칙과 지방금융조합 설립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그 해 8월 광주지방금융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130여 개의 지방금융조합을 설립했다.
금융조합은 영농자금대부를 비롯해 농산물 위탁판매, 종자나 비료 구매 등 업무가 목적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를 지향했지만 실제는 총독부가 직접 통제하고 농촌화폐정리 사업, 납세 선전, 농사 지도 장려 등 식민 지배 말단기관의 역할이었다.
지방금융조합은 1914년과 1918년 법령 개정을 통해 농촌촌락과 도시에도 금융조합을 설치하고 각 도(道)에 금융조합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점차 체제를 정비했다. 또 구매나 판매 사업을 제한하고 농업자금 이외의 대부사업도 벌여 1938년 말 조선식산은행에 버금가는 금융기관이 됐다. 1945년까지 912개의 조합이 있었고 1956년 농업은행 설립으로 해산됐다.
평택지역에는 1914년 평택금융조합이 시작돼 서정리금융조합, 안중금융조합이 설립됐다. 평택금융조합은 조합원 출자로 설립됐으며 1921년 당시 888명 조합원이 있었다. 1922년 9월에는 조합원 수가 1,027명, 대부금이 16,438원 34전, 대부액 138,269원이었다. 1924년 오성면 안중리에 안중금융조합이 설립됐으며, 경부선 서정리역 앞에 서정리금융조합이 설립됐다.
평택금융조합은 평택역 광장 우측 북쪽에 있었다. 1950년 7월 평택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됐다. 금고만은 2009년까지 민가 안에 남아 있었다. 2009년 평택역 민자역사에 서부역 광장이 확장돼 철거됐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90호)에서는 ‘평택시 근대문화유산 - 원평동 한성공동창고 터’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8-11
-
-
평택시史로 보는 ‘원평동 평택군청 및 평택경찰서 터’
-
-
1914년경 경기도 경무부 산하 진위경찰서 설치되면서 시작
▲ 일제강점기 평택군청 터(2013)
평택지역은 갑오개혁(1895) 이후 진위군·수원군·평택군으로 정리됐다. 1914년 세 지역을 통합해 진위군을 설치했다. 본래 진위군의 중심은 진위면 봉남리였지만 일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병남면 군문리에 군청(郡廳)을 신설했다. 한국전쟁 때 유엔군 폭격으로 군청과 경찰서가 불에 타자 본정통의 평화병원이 임시 군청으로 사용되다가 1954년 2월 철도 동쪽 비전1동에 군청을 신축 이전했다.
평택경찰서는 1910년 수원헌병대 평택분견대가 설치되고, 1914년경 경기도 경무부 산하 진위경찰서가 설치되면서(총독부 직원록에 1914년부터 직원명단이 나타남) 시작됐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조선주답헌병조령(朝鮮駐掘憲兵條令, 칙령 343호)에 따라 헌병이 군인신분으로 일반치안업무를 담당했다.
총독부 경무총감은 주한헌병사령관이 맡았고, 각 도의 경무부장은 해당 도(道)에 파견된 헌병대장이 담당했다. 1910년 각 도 경무부장 아래에 헌병기관이 640개, 경찰기관이 480개가 설치되고, 헌병은 2,109명, 경찰관은 5,693명이 배치됐다. 경기도에는 수원헌병대가 있었고 평택지역에는 분견대가 설치됐다.
▲ 일제강점기 평택세무서 터(2013)
평택지역에는 수원헌병대 평택분견대와 진위경찰서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진위경찰서의 위치는 파악할 수 없고, 1919년 경찰행정의 독립 과정에서 평택경찰서로 명칭을 바꾼 뒤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평택경찰서는 원평로 59번길(평택단위농협 원평동 지점 서북쪽)에 있었다. 당시 경찰서는 진위군청과 등을 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진위군청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면 평택경찰서 입구는 서쪽에 있는 형태였다.
평택경찰서는 1950년 7월 원평동 일대가 유엔군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됐다. 수복된 뒤 원평동 평화병원 건물 등을 전전하다가 1953년 12월 26일 비전동으로 이전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8호)에서는 ‘평택시 근대문화유산 - 원평동 평택금융조합 터’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8-04
-
-
평택시史로 보는 ‘원평동 옛 평택역 광장 터’
-
-
일제강점기 주요 집회, 3·1만세운동, 시민체육대회 개최됐던 공간
▲ 1920년대 평택역 앞 본정통
◆ 원평동 옛 평택역 광장 터
경부선 평택역은 1905년 1월 1일 개통됐다. 당시 평택역은 평택군 군물진리와 진위군 병314남면 통복리 사이에 설치됐다. 철도역에서 좌우로 1등 도로(국도 1호선)가 가설되고 넓은 역 광장이 만들어졌으며, 서쪽으로 본정통(혼마치)이라는 일본인 상가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경부선 평택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시가지가 조성되자 철도역 주변은 행정과 상업, 금융과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일제강점기 평택역 광장은 주요 집회, 3·1만세운동, 시민체육대회나 초등학교 연합운동회도 개최됐던 공간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신탁통치반대집회 등 각 정치집단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집회도 열렸다. 역광장은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 오인 폭격으로 평택역과 그 일대가 파괴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종전 뒤 역사(驛舍)가 철도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역 광장도 함께 옮겨졌다.
▲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제대 및 성수대(2009)
◆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제대와 성수대
대한성공회 안중교회는 1934년에 설립됐다. 1935년 박병무 신부가 주임사제가 돼 성당을 신축했다. 건축양식은 강화읍성당처럼 전통 한옥 양식의 내부는 바실리카양식으로 꾸몄다. 건물은 1999년 현재 건물을 신축하며 사라졌고 미사 때 사용되던 석조제대와 성수대(聖水臺)만 남아있다. 제대(祭臺)는 성체성사할 때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며, 성수대는 교회에 입당하기 전 성수를 담아두던 그릇이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8호)에서는 ‘평택시 근대문화유산 - 원평동 평택군청 및 평택경찰서 터’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7-24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향교 앞 선정비군’
-
-
보호각 안 모두 9기 있어… 유영환선정비는 평택지역 유일한 철비
▲ 평택향교 앞 선정비각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평택향교 앞 보호각 안에는 모두 9기의 비가 있다. 나머지 8기가 모두 석비(石碑)인데 반해 유영환선정비(兪永煥淸簡愛民善政碑)는 평택지역에서는 유일한 철비(鐵碑)다.
평택향교 앞 선정비는 조선시대 지방관을 기리는 비가 5기, 대한제국의 지방관 1기,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비가 3기이다.
지방관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정의준으로 1826년(순조 26) 평택현감에 제수돼 직산현감을 겸했다가 1828년 세곡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파직 당했다. 윤영환·윤대동·정의준·남명학 같은 인물은 재직 중 또는 이임하는 당해에 선정비가 세워졌는데 이는 지역민이 순수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현재의 비는 ‘소작인일동’이라는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지주이면서도 궁핍한 소작인들을 구휼해 소작인들이 송덕비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7호)에서는 ‘선정비 - 강범수애민선정비, 이용익애민선정비’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7-14
-
-
평택시史로 보는 진위향교 앞 ‘선정비군’
-
-
선정비 모두 17세기 이후 건립… 18기 비각 세워 보호
▲ 진위향교 앞 선정비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진위향교 앞의 비석은 모두 18기로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보호각 안에는 관찰사를 기리는 비가 2기, 현령을 기리는 비가 14기, 교육 사업에 열정을 보인 업적을 기리는 비가 1기, 현령의 비로 생각되나 인위적으로 마모시켜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1기다.
선정비들은 모두 17세기 이후에 건립됐다. 이 비석들 중 재임 중에 세워진 비가 2기, 재위한 마지막 해에 세워진 비가 3기, 이임(離任)한 다음해에 세워진 비가 4기이며 나머지는 이임 후 2년 이후에 세워진 비석들이다.
주목되는 인물로는 이명달을 들 수 있다. 그는 진위현령을 지낸 후 1636년 용인현령이 됐고, 1635년부터 3년 동안 안산군수를 지내면서 치적을 높였다. 그가 진위현령에서 이임한지 4년이나 지난 후에 선정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서광두는 1868년 부평부사로 재직하던 중 표창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17기의 비석이 관찰사와 현령의 비석인데 반해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貞敬夫人綾城具氏頌德碑)’는 영의정을 지내다 을사조약 이후 진위면 봉남리로 내려와 살았던 심순택의 부인 능성 구씨의 공덕을 기리고자 지역민들이 세운 비이다. 그녀는 낙향 후 흉년에 봉남리 일대의 빈민구제에 힘썼고 1912년 구씨학원을 열어 진위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했다. 구씨학원은 1920년대 금릉학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능성 구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운영되다가 해방 후 진위중·고등학교로 계승됐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6호)에서는 ‘선정비 - 평택향교 앞 선정비군’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7-07
-
-
평택시史로 보는 조광조·오달제 유허비 ‘충의각(忠義閣)’
-
-
평택시향토유적 제5호… 비문 내용에 의하면 1800년 6월에 세워져
▲ 충의각
◆ 충의각-조광조·오달제 유허비(소재지: 평택시 이충동 이충2지구 동쪽 공원 앞)
조광조·오달제 유허비는 이충동 추담마을 휴먼시아아파트 4단지 동북쪽의 충의각 안에 있다. 충의각은 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으로 비와 비각을 합해 충의각이라고 칭하며 평택시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됐다.
유허비 머리 부분에 ‘송장(松莊)’이 전서체로 크게 쓰여 있고 밑으로는 ‘정암 조선생·충렬 오학사 유허비(靜庵 趙先生 忠烈 五學士 遺墟碑)’라고 썼다. 또한 작은 서체로 유허비를 세운 뜻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반지산 동쪽에 선생의 터가 전하고 [盤芝之東先生遺墟]
성고개 아래에는 오학사의 옛집이 있네 [城峴之下學士舊居]
그 기백은 우리들의 마음이 경계하기를 바라니 [膽望左右我心肅如]
지극한 간(諫)함을 이어받아 글로 새겨 비를 세웠네 [敬諗來後立石以書]
숭정기원후 세 번째 경신년 6월 세우다 [崇禎紀元後三庚申 六月日 立]”
▲ 조광조·오달제 유허비
비문 내용에 의하면 이 비석은 1800년 6월에 세워졌다. 비석을 세울 당시 진위 유림에서 조광조, 오달제 선생의 자취가 있음을 길이 전하고자 나라에 청해 허가를 얻었다고 한다. 비석의 위치는 오달제의 옛 집터가 있는 산 윗부분이었다. 이 비는 1950년대까지 길옆에 방치돼 있었다가 1960년대부터 동령마을 주민들에 의해 관리됐다.
1976년 비각 건립이 추진돼 당시 송탄읍장을 비롯해 각 학교·기관·단체장들의 성금으로 ‘충의각’을 세웠다. 2002년 이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고 큰 길이 나면서 길 건너 원래 위치에서 남서쪽 50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5호)에서는 ‘선정비 - 진위향교 앞 선정비군’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6-30
-
-
평택시史로 보는 ‘대동균역만세불망비’
-
-
가호마다 부과했던 공납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 일반 농민 부담 줄어
▲ 대동균역만세불망비
◆ 1608년 이원익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후 1708년 전국적으로 실시
호서지역에 대동법을 시행한 김육(金堉, 1580~1658)의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해 그가 사망한 이듬해인 1659년에 건립됐다. 비의 높이는 175cm, 폭은 84cm, 두께는 23cm다. 비석의 글은 이수광의 아들이면서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당대의 명문장가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글씨는 조정의 길사나 흉사의 책문을 많이 썼던 의정부 우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김육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사람인 김식의 증손자 김흥우와 조광조의 증손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초년(初年)은 매우 불행했다. 13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피난길에 올랐고 15세에 부친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조모와 모친을 차례로 잃은 뒤 서울 고모 댁에 의탁해 지냈다. 26세에 사마시(司馬試) 합격으로 진사가 돼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광해군 때 실세인 정인홍을 유적(儒籍)에서 삭제한 사건이 문제가 돼 34세에 경기도 가평의 잠곡(潛谷)으로 이주했다.
44세인 1623년 인조반정 후 다시 관직에 진출할 때까지 꼬박 10년 동안 농사와 숯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김육은 관직 생활 내내 안민(安民)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방관으로 처음 발령받은 음성현감 시절부터 ‘민(民)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 안정의 근본’임을 피력하기 시작한 후 ‘민생의 안정’이 관직 생활 내내 그의 활동에서 중요한 명분이 됐다. 인조반정 이후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효종 때에 우의정에 발탁됐고 영의정까지 올랐다.
대동법은 가호(家戶)마다 부과했던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양반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세금제도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해 1708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 그만큼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
김육이 병자호란 후인 1638년 충청도관찰사로 재임했을 때 백성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했음을 살피고 상소한 내용의 핵심이 대동법 시행이었다. 여기서 ‘(대동법을 시행하면) 면포 1필과 쌀 2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라고 해 대동법 시행으로 어용상인 등 모리배들의 사욕을 채우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육의 노력은 비변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효종 즉위(1649년)와 더불어 우의정으로 발탁된 김육은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대동법 시행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별도의 글을 올렸다. 김육은 ‘대동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는 방도가 되지만, 모리배들이 방해할 것’을 염려했다. 그해 12월 좌의정 조익이 “왕정(王政) 가운데 대동법보다 큰 것이 없는데 어찌 한 두 가지 일이 불편하다 해 행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김육은 “대동법은 지금 모든 조례(條例)를 올렸으니 전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행하시고 불가하면 신을 죄주소서”라며 깊은 소신을 밝혔다. 민생안정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소신을 펼수록 반대파들의 도전도 거셌지만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1651년(효종 2)에 영의정에 오르고 드디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충청도에서의 대동법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과에 힘입어 1657년부터 대동법을 호남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사망하던 해(1658년)에 전라도 연해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봤다. 김육은 자신의 죽음으로 전라도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까 걱정해 경세의 재주가 있는 서필원을 전라도 감사로 천거해 완수를 의뢰했다. 1662년에는 전라도 산간 지역에, 1678년에는 경상도 지역에 순차적으로 대동법의 시행이 확산됐다.
김육이 사망하자 충청도 사람들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애통해 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대동법 혜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변한다. 이들은 제문(祭文)을 지어 추도하고 부의를 모아 조문했다. 하지만 상가(喪家)에서 부의를 받지 않자 이들은 김육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충청도로 들어오는 큰길가에 세웠다. 원래는 원소사 마을의 소사원(素砂院) 자리에 있던 것을 지금의 고갯마루로 옮긴 것이다. 비신(碑身)의 높이 175cm, 넓이 84cm, 두께 23cm이며 귀부와 이수가 잘 갖추어져 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4호)에서는 ‘유적과 유물 - 충의각(忠義閣)-조광조·오달제 유허비’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6-16
-
-
평택시史로 보는 ‘도일동에 소재한 원균·원연의 묘’
-
-
신도비 1기, 문인석 2기, 무인석 2기, 석등 1기, 묘비 2기 서 있어
▲ 원릉군 원균 묘역
◆ 원균(元均)의 묘(소재지: 평택시 도일동 산82)
원릉군 원균(1540~1597)은 자는 평중(平中)이며, 선무공신·숭록대부·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원릉군(宣武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原陵君)에 추증됐다.
묘역은 임금이 녹훈 봉작 교서와 제문을 내려 봉표치제 했다. 배(配)는 파평 윤씨이다. 신도비 1기, 문인석 2기, 무인석 2기, 석등 1기, 묘비 2기가 서 있고, 설화가 전해지는 애마총이 묘 아래쪽에 있다. 사당은 묘의 서북쪽에 있다.
◆ 원연(元埏)의 묘(소재지: 도일동 산79)
원연(1543~?)은 문신으로 자는 광보(廣甫), 시호는 충절(忠節), 원준량의 차남이다. 1567년(명종 22) 사마시에 3등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사재를 모아 진위현 의병을 모았고, 용인 김량장리에서 왜적과 맞서 승리해 경기좌도로 침범을 못하게 했다.
임진왜란 후 연기현감, 적성현감 겸 양주진관병마절제도위로 임명됐으나 관찰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낙향했다. 증직으로 이조참의에 봉해졌고 1679년 충절인으로 정려됐다. 1829년(순조 29) 아들 사립과 함께 양세 충효정문을 세웠다. 묘역에는 묘표와 상석만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3호)에서는 ‘유적과 유물 – 대동균역만세불망비(大同均役萬世不忘碑)’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6-12
-
-
평택시史로 보는 ‘조선 선조 충신 이대원의 묘’
-
-
왜구가 흥양에 침입하자 군사 이끌고 손죽도에서 싸우다 전사
▲ 이대원 묘역
◆ 이대원(李大源)의 묘(소재지: 포승읍 희곡리 산83-5)
이대원(1566~1587)의 본관은 함평(咸平)이며, 자는 호연(浩然)이다. 1583년(선조 16)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역임하였고, 전라도 녹도(鹿島) 만호(萬戶)가 되었다. 1587년(선조 20) 남해안에 왜구가 출몰하자 그들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왜구가 흥양(興陽)에 다시 침입하자 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손죽도(巽竹島)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속저고리에 피로 써 보낸 절명시 28자를 받아 고향 대덕산 밑에 장사를 지냈고, 제일(祭日)은 말이 혈서의 속적삼을 물고 온 날인 2월 20일로 정해 제향한다.
임진왜란 6년째인 정유년에 왜군이 전라도 손죽도에 몰려와 이장군의 사당에 불을 지르자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불이 꺼졌기에, 나라에서 소나기 ‘확’ 자를 써서 ‘확충사’라고 사액이 내려졌다고 한다.
1675년 사당 입구에 신도비가 만들어졌다. 신도비는 높이가 300cm이며, 비신은 220cm, 너비 85cm, 두께 40cm이고 대리석이다. 대좌에는 물결무늬가 조각돼 있고, 글씨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비문은 남구만이 찬하고 김진규가 전액했고 조상우가 글씨를 썼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2호)에서는 ‘평택시 각 지역 묘역 - 원균(元均)의 묘’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6-02
-
-
평택시史로 보는 ‘병자 삼학사 홍익한의 묘’
-
-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서 청나라에 끌려가 뜻 굽히지 않고 죽임당해
▲ 홍익한 묘역
◆ 홍익한(洪翼漢)의 묘(소재지: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322)
홍익한(1586~1637)의 묘는 처형 장소나 매장처가 확실치 않아, 그가 평소 타던 안마와 의금만을 수습해 함정리(옛 경정리)에 장사지냈다. 일제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1942년 본정리 꽃산에 묘만 이장했고 묘비·비석들은 그대로 버려져 있다가 1964년 현재의 위치로 비각을 옮겼다. 1982년 비각 전부를 꽃산의 홍학사묘 옆에 옮겨 놓았다.
홍익한은 초명은 홍습(洪霫),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찬성(贊成) 홍숙(洪淑)의 현손(玄孫), 진사 홍이성(洪以成)의 아들로 백부인 교위(校尉) 홍대성(洪大成)에게 입양된 후 서울 마포에서 자랐다.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봉림대군·윤집·오달제와 함께 척화파로서 청나라에 끌려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한 ‘병자(丙子) 삼학사(三學士)’의 한사람이다.
묘소 앞에는 묘표와 문인석 2기가 있고, 묘역 전면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포의각이 있다. 홍익한 묘표는 2기가 있는데, 현재 묘소 앞에 세워진 것은 1689년(숙종 15)에 만들어진 것으로 월두형 비신양식이다. 규모는 비신 48.5×17×127cm이고, 비대는 87×57×29cm로 외증손 심사성이 글을 쓴 것이다.
포의각 내에 있는 묘표는 비신이 54×21.5×124cm, 비대는 106×82×24cm, 옥개석은 104×79×39cm로 1831년(순조 31) 이의현이 찬한 것이다.
홍익한 묘갈은 1725년(영조 1)에 포의사가 전결을 획급 받을 때 1726년(영조 2) 건립한 것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민진원이 전액하고, 이의현이 쓴 것으로 글씨가 마멸돼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비문의 23행 중 왼쪽 모서리가 깨어져 1행은 소멸됐다. 규모는 비신이 54.5×29×125cm이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1호)에서는 ‘평택시 각 지역 묘역 - 이대원(李大源)의 묘’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5-29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 ③
-
-
석정리 장성, 마장의 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장성인 마장성
▲ 석정리 장성
◆ 석정리 장성(소재지: 안중읍 학현리·성해리, 포승읍 석정리 일대, 시대: 조선시대)
홍원목장 마장성은 경기도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 홍원목장 마장성’과 ‘평택 석정리 장성’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에 “홍원곶은 용성현에 있는데 수원부 남쪽 55리이다. 둘레가 75리이고 목장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홍원목장에는 감독관이 파견돼 주변 일대의 목장까지 관장했다.
양성현조에는 “괴태길곶마장 현서쪽 100리 승량동면에 있는데 세 방향이 바다로 가로 막혀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돼 있다. 홍원목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기록돼 있다. 수원부의 홍원곶마장과 양성현 괴태곶 마장을 수원부 홍원마장에서 관리하면서 마장성이 변화했다.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피라산 기슭으로부터 시작해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城海里)·포승읍 석정리(石井里)·원정리(遠井里)·괴태길곶(槐台吉串)봉수에 이르기까지 약 8Km 정도에 걸쳐 토축으로 쌓아진 마장(馬場)의 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장성(長城)인 마장성(馬場城)이 됐다.
목장토성 관련 유구로 동·북·서 세 방향에 토담을 두른 대형 집자리에는 내부에 3기의 건물이 존재했다. 조선시대 후기 기와편과 백자편이 발견되며, 목관(牧官)이 거처하던 관아터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80호)에서는 ‘평택시 각 지역 묘역 - 홍익한(洪翼漢)의 묘’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5-19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 ②
-
-
덕목리성, 통일신라 수성군 4영현 중 광덕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
▲ 덕목리성
◆ 덕목리성(소재지: 현덕면 덕목4리, 시대: 고려시대)
덕목리성은 통일신라 수성군(水城郡)의 4영현 중 광덕현의 치소(治所)가 있었던 곳이다. 고등산의 끝자락 낮은 구릉인 성안마을 방향으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60m의 거리를 두고, 독특하게 동성(東城)과 서성(西城)으로 나누어져 배치돼, 동서 방향으로 있는 토축의 방형 평지성이다. 성벽의 높이는 외벽이 8~10m, 내벽은 2~3m, 하단 너비 5~7m, 상단 너비 1~1.3m 가량 된다. 성 밖으로는 폭 3~4m, 깊이 0.5~1m 정도의 외황이 설치돼 있다.
1942년 발간된 『조선고적조사자료』에는 “현덕면 덕목리, 토루고1간내지3간(土壘高一間乃至三間) 폭이 넓은 곳은 5간 정도, 주위 약 180간 명칭불명(周圍 約180間 名稱不明)”이라고 돼 있고, 문화유적총람(1977년)에는 “…4각의 토성으로 2개의 성지가 있으며 동쪽은 2,000평가량, 서쪽은 4,000평가량으로 일부는 주택이 건립돼 있고 1개의 성지는 현재 형태만 잔존하고 있고, 소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축성방식은 사질점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다져쌓기(판축)를 했다. 현재 동성은 거의 파괴되고, 성문지(城門址)는 서성의 북벽에서 확인되며 현재는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성곽 시설물로는 서성 내에 문지 1개소, 치성 1개소, 건물지 1개소 등이 있다.
고려 말기에는 하양창 등을 중심으로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했던 지역이었다. 성곽이 많이 축성된 지역으로 성(城)의 규모가 작고, 성곽 축조 방법으로 보아 광덕현 읍성(邑城)으로 고려시대 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9호)에서는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 - 석정리 장성’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5-12
-
-
평택시史로 보는 ‘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 ①
-
-
농성, 구릉의 경사지 이용해 고려시대 해안 방어 위한 토축의 평지성
▲ 농성
평택서남부지역의 성들은 옛 폐현(廢縣)과 관련돼 축성됐거나, 조운(漕運)로의 확보를 위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정리 농성(農城)은 평택현의 읍성, 덕목리 광덕현성은 동, 서로 2개의 성이 마주 보고 축조됐는데, 덕목리는 고려 초 수주부의 광덕현의 치소(治所)로 광덕현 읍성(邑城)이었을 것이다. 포승읍 원정리 목장성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포승면 홍원리와 원정리에 설치된 목장의 말과 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장이 확대되면서 석정리 감기마을에서 성해리까지 쌓았다.
◆ 농성(소재지: 팽성읍 안정리 산41-5,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74호)
안정리 농성(農城)은 ‘이성(夷城)’, ‘이성(里城)’이라고 부르며, 구릉의 경사지를 이용해 고려시대 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한 토축의 평지성이다. 평면 형태는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을 하고 있다.
성벽은 전체 길이가 305m로 동벽 93m, 서벽 85m, 남벽 56m, 북벽은 71m이다. 성벽의 높이는 동벽과 북벽이 8~10m로 높고, 남, 서쪽은 6~8m로 다소 낮다. 내벽 높이는 3~4m 정도이고 상단 높이 1.5m~2m 하단너비가 4~7m 정도이다. 성내 면적은 14,900㎡이며, 문지는 동벽과 서벽 중간부에 위치하며 크기는 상단 너비 8~10m 하단너비 2m 내외이다. 높이는 4~5m가량이다.
축성 시기는 삼국시대, 나말여초, 고려설 또는 임진왜란설 등 많은 이견(異見)이 있다. 성곽 축조 방법이 고려 때 만들어진 덕목리성, 처인성 등과 유사하며 출토유물들이 고려시대 것이 많다. 이성(夷城)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고려사』에 고려 1377년(우왕 3) 왜적이 경양을 침범하고, 평택을 점령해 양광도 부원수 인해가 이기지 못했던 기록이 있어 고려 말에 축조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8호)에서는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 - 덕목리성’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5-12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북부지역의 성곽 유적’ ⑤
-
-
무성산성, 성벽 동·남·북벽은 산 정상부 감싸며 축조된 테뫼식
용성리 강길마을성, 토축 성으로 성벽 길이는 약 90m 잔존
▲ 무성산성
◆ 무성산성(武城山城, 소재지: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산48 일대,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202호, 시대: 삼국시대)
무성산성은 무성산의 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여서 남쪽 덕우리 원덕우 마을 뒤의 자미산, 비파산으로 이어진다. 성벽(城壁)의 동·남·북벽은 산 정상부를 감싸며 축조된 테뫼식이지만, 서벽(西壁)은 계곡을 가로질러 축성돼 포곡식과 테뫼식이 혼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성의 모양은 남북이 길쭉한 장타원형이다. 경기도 박물관의 발굴조사(1999) 결과 성내의 총면적은 5,650㎡이고 둘레는 547m임이 밝혀졌다. 또 남북의 길이는 157m이고, 동서의 길이는 77m이었다.
성내의 시설물은 문지(門址) 2개소, 치성(雉城) 2개소, 장대지 1개소, 수구지 1개소 추정, 건물지 6개소가 발견됐다. 성벽의 너비는 상단이 남벽은 1.5~2m, 서벽은 1~1.5m, 북벽은 1.5~2.5m, 동벽은 1.5~2m로서 전체적으로 2m 내외이다. 외벽 높이는 남벽 7~9m, 서벽 6~7m, 북벽 4~6m, 동벽 5~7m이다. 내벽 높이는 대체로 1.5~3m 내외이며 회곽도가 개설돼 있다. 성벽의 해발 고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100m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용성리 강길마을성
◆ 용성리 강길마을성(소재지: 안중읍 용성2리 강길마을, 시대: 고려시대 추정)
용성리 강길마을성은 성벽이 강길마을 서북 방향에서 북쪽의 산 능선으로 오르는 농경로와 평행하게 진행되는 토축(土築)의 성이다. 성벽의 길이는 약 90m가 잔존한다. 현재는 북서쪽의 경사면이 평평하게 깎여서 농경지화 했고 나머지 토루(土壘)들도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나 성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길을 건너 남서쪽으로 진행하던 약 30m가량의 토루는 거의 흔적이 없어졌다. 토루 내벽 높이는 1~2m, 외벽의 높이는 1.5~2.5m이며, 상단 너비는 1m, 하단너비는 1~2m가량이다. 전체적인 성벽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 강길 마을을 타원형으로 감싸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6호)에서는 ‘평택서남부지역의 성곽 유적’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4-21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북부지역의 성곽 유적’ ④
-
-
용성리성, 안중읍 용성3리 낮은 구릉 따라 축조된 토축 평지성
백봉리 산성, 청북면 백봉1리 육자봉에 축조된 토축 테뫼식 산성
▲ 용성리성
◆ 용성리성(龍城里城, 소재지: 안중읍 용성리 455외 28필지,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205호, 시대: 고려시대)
용성리성은 안중읍 용성3리 낮은 구릉을 따라 축조된 토축 평지성(平地城)이다. 1942년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토루 주위 약 260칸, 높이 1칸 내지 2칸, 폭이 높은 곳은 5칸인데 용성현시대의 향교지라 전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용성리성은 비파산 동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면 형태는 북벽이 약간 짧은 사다리꼴 형태로 보이나 축조당시에는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형은 단면상 북고남저(北高南低), 동고서저(東高西低)로, 동서 길이는 87m, 남북길이가 128m, 전체둘레는 449m, 면적 10,550㎡이다.
성지의 시설물로는 문지(門地)는 3개소, 치성은 5개소가 확인되며, 성내 시설물은 건물지 5개소와 수구지 1개소가 있다. 용성리성은 규모가 작고, 능선으로 연결돼 있어 비파산성지와 연계된 방어시설로 일종의 부성(副城)으로 추정된다.
◆ 백봉리 산성(소재지: 청북면 백봉 1리 원백봉, 시대: 삼국시대 백제)
백봉리 산성은 청북면 백봉1리 육자봉(61.5m)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한 토축의 테뫼식 산성이다.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장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는 220m이고 성벽 높이 3~5m 내외로 서벽과 북벽이 다른 성벽보다 높게 쌓여 있다. 성벽은 편축식으로 축조했으며, 동북 모서리 부분에만 외벽에 유단시설이 남아 있다. 무문토기와 백제시대의 타날문 토기가 출토돼 백제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6호)에서는 ‘무성산성(武城山城)’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4-14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북부지역의 성곽 유적’ ②
-
-
비파산성, 북쪽과 남동쪽 용성리 뒷골 포함 포곡식 토축 평산성
▲ 비파산성
◆ 비파산성(琵琶山城, 소재지: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6-1 외 24필지,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204호)
비파산성은 안중읍 용성3리 설창마을과 덕우1리 원덕우 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비파산(琵琶山, 해발 102.2m)의 북쪽 정상부와 남동쪽 하단부의 용성리 뒷골을 포함해 축조된 포곡식 토축 평산성이다.
1942년 발간된 『조선보물조적조사자료』에는 “토루 주위는 약 700칸으로 토루가 확실한 곳은 약 300칸이며 높이는 약 9척으로 용성현지라고 한다고 전한다”와 19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에는 “…높이 8m, 폭 3m, 길이 90m의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1962년 부락에서 제방공사를 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비파산성은 지형상 서고동저(西高東低) 북고남저(北高南低)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서벽과 북벽은 비파산의 주능선을 따라 진행되고, 남벽과 동벽의 일부는 얕은 능선이 감싸며 돌아가고 있다. 이 양 능선 사이의 계곡을 막아 동벽을 축조했다. 성벽의 길이는 동벽 약 124m, 남벽 339m, 서벽 430m,북벽 682m로 전체길이는 약 1,622m에 이른다.
성내 시설물로는 문지 5개소와 치성 4개소, 건물터 14개소, 음료유구 5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성내외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기와편과 토기편, 자기편이 산재해 있다. 비파산성은 거성현 치소로 축조돼 행정치소 및 해안방어의 중심 기능을 했던 성으로 당시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5호)에서는 ‘용성리성(龍城里城)’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4-07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서북부지역의 성곽 유적’ ①
-
-
아산만 입구, 안성천 하류의 전략적 중요성 알 수 있는 삼국시대 산성
▲ 자미산성
평택서북부지역의 성곽유적은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거성현(車城縣), 고려의 용성현(龍城縣), 조선시대를 거치며 축성됐다.
◆ 자미산성(慈美山城, 소재지: 안중읍 용성리 산68 외 14필지,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203호, 시대: 삼국시대)
자미산성은 북쪽의 무성산에서 뻗어온 산줄기가 산성이 위치한 자미산(110.8m)으로 이어져 남쪽의 비파산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북쪽으로 무성산성, 동쪽으로 용성리 강길마을성,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에 비파산성, 용성현성 등이 자리 잡아, 아산만 입구와 안성천 하류의 해양방어체계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1942년 발간된 『조선보물조적조사자료』에는 “토루 주위 약 삼백간이 모두 붕괴되어 명확하지 않으나 산의 사면이 삭토해 이곳에 토벽을 붙인 듯하다 하여 자미산성이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문화유적총람』에는 “지금 남아있는 석성(石城)의 형태가 원형으로 둘레의 길이는 약 150m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다.
‘자미’는 ‘북두칠성’을 나타낸다. 자미산 정상부 주위를 토축으로 축조한 내성(內城)과 정상부에서 이어지는 7~8부 능선을 따라 석축으로 이루어진 외성(外城)과 자미산 정상부에서 동쪽 능선의 110m 거리에 토축으로 이루어진 부성(副城)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내성·외성과 부성으로 이루어진 삼중구조이다. 성내 시설물로는 건물 추정지 9개소, 장대지, 추정 동문지와 적대, 추정 수구지, 동·서·북 치성 등이 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4호)에서는 ‘비파산성(琵琶山城)’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3-31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지역의 성곽 유적’ ⑧
-
-
고려시대에 축성돼 아산만, 안성천, 진위천 통해 들어오는 왜적 방비
▲ 방축리산성 동치성
◆ 방축리산성(소재지: 고덕면 방축2리, 시대: 삼국시대 추정)
방축리산성은 방축 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장안산(해발 53m) 토축의 포곡식 평산성이다. 성의 둘레가 2.2km 정도로 지형의 단면은 동고서저, 북고남저 형으로 동서를 장축으로 사다리 형태로 농경지를 따라 형성돼 있다. 서천사 뒷편 성황목자리 주변이 동치성으로 추정되며, 옆으로 동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안산에서 기와편이 나와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축리는 동고리, 궁리 등과 함께 본래 양성현 지역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 영풍현으로 고쳐 수성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인 오타장(吾朶莊)이 있었고 조선시대 오타면이 있었던 곳이다. 영풍현의 읍성을 보호하면서 조선초기 항곶포와 내륙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편찬된 『송탄시사』에 의하면 방축리 성지로 소개되는데 약 400여 년 전에 경주 김씨(경순왕의 29세손)가 성두(城頭, 성머리)마을에 입향(入鄕)했을 때 마을에는 도적떼가 심해 토족(土族)이었던 공(孔)씨, 봉(奉)씨 문중과 의형제를 맺은 후 뒷산에 토성(土城)을 쌓고 도적을 방비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축성돼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 좌교천을 통해 들어오는 왜적을 방비했고, 조선시대에는 조창과 관련해 항곶포를 보호했다. 임진왜란 때 승병 1,500명을 이끌고 서천사 부근에 머물렀던 사명당이 왜적의 방비를 위해 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도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3호)에서는 ‘평택서북부지역 - 자미산성(慈美山城)’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3-24
-
-
평택시史로 보는 ‘평택지역의 성곽 유적’ ⑦
-
-
영신고성, 동고서저·북고남저 삼태기형... 토축 포곡식 평산성
지제동산성, 울성마을 북쪽 테미산에 위치하는 테뫼식 토축산성
▲ 영신고성 동벽
◆ 동삭동 영신고성(永新古城, 소재지: 동삭동 원동삭(작은말), 시대: 고려시대 추정)
동삭동 영신고성은 두리봉에 있는 토축의 포곡식 평산성이다. 단면은 동고서저, 북고남저의 삼태기형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신고성’이라 기록돼 있고, 평택문화원에서 1991년 간행한 『향토사료집』 제1권에는 “마도 두리봉에 토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신마을에서 칠괴동으로 통하는 곳이 북문지로 추정된다.
영신지역은 고려 초인 940년(태조 23) 영풍현을 영신현으로 개칭해 1018년(현종 9) 수원의 속현으로 됐다가, 조선 초인 1433년(세종 15) 진위현에 병합됐다. 『여지도서』에 여방면 관할동리가 6개 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영신리가 있다. 이 영신리가 고려시대 영신현의 읍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의 동삭동으로 모산골, 서재, 영신 자연마을이 있으며, 영신은 동삭·중간말·큰말로 나뉜다.
동삭동 영신마을(작은말-원동삭-동촌) 동편에 있는 두리봉(해발 43m)의 야트막한 구릉에 오르면 30미터 내외의 주변 구릉들이 한눈에 보이며, 영신골·영신들·배기다리까지 잘 조망된다. 조선 태종 때 폐지된 옛 영신현의 읍성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제동산성
◆ 지제동산성(소재지: 지제동 울성마을, 시대: 삼국시대 추정)
지제동산성은 울성마을의 북쪽 봉우리 테미산(해발 56.1m)에 위치하는 테뫼식의 토축산성이다. 둘레는 220m 정도이며, 평면은 동서로 긴 타원형을 하고 있다. 북사면으로 공동묘지가 있어 성벽의 파괴가 극심한 편이고, 동·남사면에서만 일부 편축(片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벽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동서 14m, 남북 22m의 평탄대지가 조성돼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채집되고 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72호)에서는 ‘평택동남부지역 - 방축리산성’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