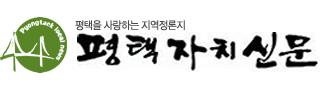본지 전문 필진인 김희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이 매주 조선왕실의 장태 문화를 상징하는 태실(胎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된 왕의 태실은 총 24기로, 지난호에는 <가봉태실의 복원 방향성을 보여준 예천 문종대왕 태실>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단종대왕의 태실이 두 곳인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성주 단종대왕 태실과 법림사(法林寺)
조선의 여섯 번째 임금이자 숙부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뒤 영월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단종대왕(端宗大王, 재위 1452~1455, 이하 단종). 지금도 강원도 영월군에는 단종의 유배길을 비롯해 유배지인 청령포(淸泠浦)와 무덤인 장릉(莊陵) 등 단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淸泠浦)의 전경

영월 장릉(莊陵). 조선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에 조성된 왕릉이다. 대부분의 왕릉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장릉은 단종이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영월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단종의 태실은 최초 선석산(禪石山)에 있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 있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출토된 아기비와 장태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1451년(문종 1년), 단종의 태실은 성주 법림산(法林山)으로 옮겨 조성되었다. 이는 문종(文宗, 재위 1450~1452)이 즉위하면서 단종의 신분이 동궁(東宮, 세자)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차기 왕위 계승자의 신분에 맞춰 별도의 가봉을 염두에 두고 태실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종의 아기씨 태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 있는 해당 비석과 석물을 통해 최초 선석산에 단종의 태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림산(法林山)으로 옮겨진 단종의 태실지. 현재 민묘가 들어서 있으며, 주변으로 가봉태실과 관련한 석물이 흩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종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안태사(安胎使)였던 예조 판서 허후(許詡)가 동궁의 태실을 옮겨 조성한 뒤 문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뢴다.
“이제 동궁(東宮)의 태실(胎室)을 성주 가야산(伽倻山)*에 옮겨 모시고 그 사역(四域)을 정하였는데, 동쪽과 남쪽은 각각 9천6백 보(步), 서쪽은 9천5백90보, 북쪽은 4백70보로 하여 표(標)를 세우고, 또 품관(品官) 이효진(李孝眞) 등 여덟 사람과 백성(百姓) 김도자(金道者) 등 여섯 사람을 정하여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 『문종실록』 1451년 3월 6일 중
* 해당 기록에서는 성주 가야산(伽倻山)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세조실록』에는 법림산(法林山)에 노산군(魯山君)의 태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문종실록』과 『경산지(1677)』에 따르면 단종의 태실 인근의 사찰인 ‘법림사(法林寺)’의 존재가 확인된다. 지난 2012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옛 가천초등학교 법전분교의 북편 일대에서 기단석축과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법림사지로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단종 태실과 법림사의 위치를 고려할 때 태실수호사찰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아래 『문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제 성주(星州) 태봉(胎峯)은 봉 밑[峯下] 좌액(左腋)에 법림사(法林寺)가 가장 산근(山根) 가까이 있고 민가(民家)는 한 곳에 모여 살며, 법림사 밑에 있어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가축이 밟을 까닭이 없고, 만약 민가에 불이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법림사 뒷봉[後峯]을 지난 뒤에야 태봉(胎峯)에 이를 것입니다...<후략>”
– 『문종실록』 1451년 2월 18일 중
한편, 이렇게 옮겨진 단종의 태실이 정확히 언제 가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단종의 재위 기간을 고려할 때, 즉위한 1452년부터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생한 1453년 사이에 가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종의 태실지 주변으로 가봉태실 석물의 일부가 방치된 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가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단종의 태실지에서 확인되는 가봉태실 석물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주석과 동자석, 우전석 등이 확인되며, 이밖에 민묘에 재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석과 상석 등의 석물도 확인되고 있다.

단종의 태실지인 법림산의 원경

태실지에 남아 있는 단종의 가봉태실 석물. 우전석

난간석을 이룬 석물인 동자석으로 추정되는 석물

온전하게 남아 있는 주석. 이처럼 가봉태실 석물이 지금도 태실지에 남아 있어 실제 가봉이 이루어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단종의 태실은 언제 훼손된 것일까? 관련 내용은 『세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58년(세조 4년) 7월 8일에 예조(禮曹)에서 선석산(禪石山)에 있는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1457)의 태실과 법림산(法林山)에 있던 노산군(魯山君)**의 태실을 철거할 것을 아뢰었고, 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때 단종의 태실은 공식적으로 철거되었으며, 현재 성주 법림산에 남아 있는 단종의 가봉태실 석물은 이때 파괴된 흔적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단종의 태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며 행방이 묘연해졌다.
** 노산군(魯山君): 사육신에 의한 상왕복위운동이 실패한 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다. 이후 1698년(숙종 24) 단종의 묘호를 받기 전까지 노산군으로 불렸다.
※ 참고자료
김익현(역) 『문종실록』, 197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채희순(역) 『세조실록』, 19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12
『2022 태봉·태실의 세계유산 가치성 연구』 자료집, 2022
김희태, 『조선왕실의 태실』, 2021, 휴앤스토리
김희태, 『경기도의 태실』, 2021,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