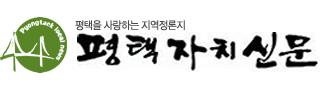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에 노동정책과로 출발해 현재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등 3개과를 아우르는 노동국으로 개편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성남시도 고용노동과 내에 노동지원팀과 노동권익팀 등 2개 팀을 두고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수원시에는 노동정책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 내에 노동정책팀 등 3개 팀을 두고 있다.
우리 평택시와 유사한 인구인 약 64만의 안산시에는 노동일자리과 내에 노동정책팀이 있으며, 인구 약 55만의 안양시에도 고용노동과 안에 노동정책팀이 있다. 우리 인근 지역인 인구 약 39만의 충남 아산시에도 일자리경제과 내에 노사상생일자리팀을 두고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와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에는 과연 정책다운 노동정책이 있는지, 앞으로라도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노동 복지와 정책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에만 있지 않고, 얼마나 노동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 경기도 노동국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노동권익서포터즈사업을 비롯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작업복 세탁 사업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노동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평택시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담 행정 공무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60만 평택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질 노동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그것을 운영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에서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첫째, 평택시와 시의회에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알바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 평택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정리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둘째,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예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부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체로 50~70%를 상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7%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 노동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 현장에서는 항상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한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생기고 권리도 증진된다.
셋째,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노동정책 부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이천, 파주, 김포 등의 사례처럼 시에서 지원하는 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의 전문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평택시민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호받고 지켜지는 도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