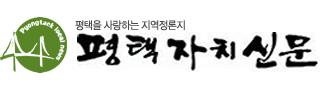[김만제의 평택의 자연] 지역적 멸종으로 가는 평택의 두꺼비
지자체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 맹꽁이·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보다 더 큰 개체수 감소

빈 독에 물을 길어다 채워야 할 콩쥐를 도와준 두꺼비, 지네에게 죽게 된 소녀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는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 등 의리 있으며 우직한 캐릭터의 두꺼비는 우리 전래동화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수 아이템이었다.
멸종위기종 혹은 천연기념물은 아니어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권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제한된 서식지마저 막다른 길에 막혀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는 맹꽁이,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보다도 더 큰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양서류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특히 두꺼비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한 두꺼비는 조만간 자취를 감추고 전래동화에서나 나오는 동물 혹은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 정도로밖에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1. 멸종에 가까운 종이 된 두꺼비

▲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양서류, 두꺼비(2013.8.5 진위면 무봉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두꺼비는 이 법에 따라 포획금지 대상이지만 포획보다는 도로와 택지개발, 도시화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에 가까운 종이 되었다.
2.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속한 수원청개구리(2020.5.23 팽성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양서류를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양서류 서식지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맹꽁이,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는 물론이고 큰산개구리와 두꺼비 등 대다수의 양서류 생존에까지 위협을 끼치고 있다. 전 세계의 양서류 5종 가운데 2종이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3. 덕동산의 맹꽁이를 대신한 두꺼비

▲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번식에 들어간 두꺼비(2025.3.15 덕동산 맹꽁이연못)
2009년 8월, 작은 연못(맹나라) 조성과 2010년 11월의 연못(꽁나라) 조성을 통해 자리를 잡은 덕동산의 맹꽁이 번식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평택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전했지만, 지금은 장맛비가 시작되어도 맹꽁이 수컷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3월 초순이면 두꺼비와 한국산개구리의 보금자리로 대신하고 있다.
4. 번식지가 부족해 논을 이용한 두꺼비

▲ 벼 그루터기를 감은 끈 모양의 알에서 부화된 두꺼비 올챙이(2012.4.28 무봉산 주변논)
주변의 두꺼비는 무봉산과 부락산 등 높지 않은 산지의 가장자리 그늘이나 습한 곳에서 서식하며, 산란기인 봄이 되면 산개구리와 함께 웅덩이에 모여들어 집단 번식을 한다. 저산지대의 웅덩이나 밭 주변 등을 선호하지만 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논 습지에 일부 개체가 내려와 산란하기도 한다. 산란지에서는 끈 모양의 투명한 알덩이를 관찰할 수 있다.
5. 무봉산 전역을 덮는 두꺼비 집단 서식지

▲ 두꺼비 올챙이로 큰 웅덩이를 가득 채운 두꺼비 집단번식지(2015.5.10 무봉산)
10여 년 전부터 무봉산 등산로와 산 가장자리, 만기사 입구 주차장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났던 두꺼비는 무봉산 뒤편 마을에서 가까운 웅덩이가 이곳의 양서류 다양성을 가능케 했다. 논과 함께 둠벙이 땅 매립으로 사라지고, 산자락의 작은 웅덩이 또한 점차 없어지는 상황에서 무봉산 두꺼비를 가능케 했던 번식지도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6. 지금은 사라진 부락산 자락의 두꺼비 번식지

▲ 오랫동안 두꺼비 무리가 이용했던 부락산 자락의 번식지(2018.3.11 부락산)
지금까지 물뭍동물이라고도 불리는 양서류에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갔던 다수는 주변에 양서류의 다양성과 함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송탄지역 지산동 남부전원교회에서 가까운 부락산 가장자리에 있던 두꺼비 산란지는 무봉산만큼 개체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 땅 매립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그 역할을 잃고 말았다.
7. 특이한 알 타래로 산란하는 다산왕, 두꺼비

▲ 투명한 끈 모양의 형태로 산란한 포접 상태의 두꺼비(2015.3.22 동천리 무봉산)
일부 양서류의 경우 번식기가 되면 수컷 개구리의 엄지발가락 아래에 혼인육지 혹은 포접돌기가 생기고 짝짓기할 때 암컷을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며, 암컷의 배를 자극해 알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은 3월 초에 산지 주변의 웅덩이에 투명한 끈 모양의 형태로 산란하며 체외수정으로 한 번에 약 2,000~10,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8. 올챙이에서 어른 두꺼비까지

▲ 3개월간의 변태기간을 통해 두꺼비의 모양을 한 어린 개체(2011.6.1 덕동산 맹꽁이연못)
양서류에 속한 두꺼비의 변태 또한 수중생활에서 육상생활로의 전환에 필요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올챙이로 자라면서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성체의 이동에 필요한 앞다리가 생겨난 후 꼬리는 저절로 줄어든다. 올챙이 시절 물속에서 풀을 뜯는데 사용한 이빨은 사라지고 곤충을 포획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발달하며, 특히 혀 근육이 발달하면서 적응과 생존의 기회가 늘어난다.
9. 포획하면 처벌받는 두꺼비

▲ 양서류 중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두꺼비(2020.3.4 덕동산 맹꽁이연못)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양서류 중에는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고리도롱뇽은 물론이고 산개구리 3종과 두꺼비와 물두꺼비도 해당하며, 멸종위기종은 아니어도 포획금지 대상의 경우 포획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0. 울퉁불퉁 당찬 외모의 두꺼비

▲ 일자로 꽉 다문 입에 울퉁불퉁 당찬 외모의 두꺼비(2013.8.5 진위면 무봉산)
두꺼비는 우리나라 토종 양서류 중에서 가장 크고, 전체로 보면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 다음이다. 껌뻑이는 큰 눈, 일자로 꽉 다문 입, 피부에 크고 작은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습성이 있어 낮에는 돌이나 풀 밑 또는 얕은 구멍 속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움직이는 것을 대상으로 먹이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