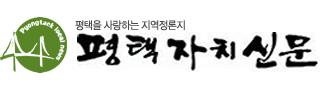바로 고통으로 인해 종교가 생겨났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말처럼 사람들이 윤리적 본분을 다한다고 해서 종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적, 정신적, 영적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엥겔스의 주장대로 기독교는 원래 억압받던 사람들의 사회운동이었다는 말에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만족하는 피조물이 아니니까요. 가령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취급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세상을 고해(苦海)라고 규정한 건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수립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교리만 해도 생로병사를 거쳐 결국은 인생무상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윤회설과 극락이 대치하는 국면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고통관은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이거니와 창조신앙에 근거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저지른 원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간의 관심사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하는가(인식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윤리학)”, “나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종교)”였습니다. 저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의 궁극적 목적을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일갈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을 앞세워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전제하지 않는 한 궁극은 요원합니다. 응당 이론적 인간 이해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인간에 대한 수식어는 죄다 동물에 견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반 퍼슨이 분류한 대로 그만한 이해도를 가지고는 존재론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네카는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기에 다행히 길지 않다는 것에 위안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본질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수생식물의 동굴 안 수분 공급원
고통받는 인간의 고통은 그의 구체적인 인격과 결부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크기를 저주로 느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북하면 예수님마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전 하나님을 향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탄원한 데 이어, 나의 하나님을 연거푸 부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만치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극심한 통증일 따름입니다. 고통받는 얼굴과 윤리적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가하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의분과 죄의식을 느끼며 남다른 윤리적 의무감을 갖는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은 어쩌면 윤리적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고통을 별반 심각하지 않게 다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지기도 했거니와 각종 의약품의 발달로 인해 여건이 나아진 덕분입니다. 문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질뿐더러 갈수록 환경오염에 의한 재앙의 빈도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을 피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요인입니다.
마무리하면 자고이래 인류사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노정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당한 고통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시행착오로 당하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지구촌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시시각각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인에게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끝으로 인간의 고통에 관한 수많은 이론을 모으고 집대성한 저자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만 앞에서 간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을 주교재로 삼지 않은 데서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통은 시시각각 죽음보다 무서운 인류의 공적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슬픔을 나누면 잘게 부서져 버리고 서로들 기쁨을 나누면 점점 커진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저자가 ‘고통의 역설’이라는 논제를 제시한 까닭입니다.
■ 프로필
- 고교생에게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며 ‘수필집·시조집·기행집’ 등을 펴냈습니다.
- 퇴임 후 기고활동을 이어가면서 기독교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 블로그 “조하식의 즐거운 집” http://blog.naver.com/johash을 운영합니다.
- 정론지 <평택자치신문>에 “세상사는 이야기”를 15년째 연재하는 중입니다.
※ 다음호(744호)에는 ‘코카서스 기행 - 아제르바이잔의 과거와 현주소’가 이어집니다.